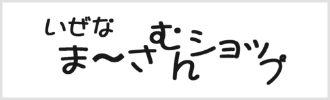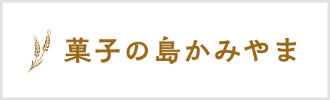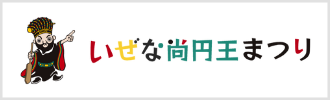최근 몇 년 사이 이제나 섬을 수학여행지로 선택하는 학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 '민박 체험의 '질'이 다른 곳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체험 내용이 좋다거나, 프로그램이 풍부하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부분, 즉 학생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사람과의 만남이 진정성 있고, 떠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 그런 체험의 '밀도'와 '확실함'이 이제나섬에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질적 수준'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체험이 '준비된 것'이 아닌 '태어나는 것'이 되고 있다.
이제나섬의 민박에서는 체험이 '완성품'이 아니다. 요리를 가르쳐 주는 호스트가 "이거 같이 만들어 볼까?"라고 말하면서 "이거 넣을래? 이쪽이 좋아? 라고 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다. 농사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해 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 같니? "어떻게 할 것 같아?"라고 묻는다. 그 자리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참여한다'는 느낌이 남는다.
'감정'이 움직이니까 기억에 남는다
웃고, 부끄러워하고, 조금 어색해하고, 마지막에는 울고.........
이제나 민박은 학생들의 다양한 감정을 흔들어 놓는다. 낯가림이 심한 아이가 밥을 먹으며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은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한다. 호스트 할머니가 옛날이야기를 들려줄 때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런 순간이 있기에 단순한 '체험'이 아닌 '기억'으로 바뀌는 것이다.
호스트는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솔직해질 수 있다.
교실에서는 볼 수 없는 표정을 여기서 볼 수 있다.
호스트들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청하는 힘'과 '사람을 받아들이는 힘'이 대단하다. 꾸짖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눈을 떼지 않는다. 그런 관계 방식 때문에 학생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다. 이 '부담감 없음'이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감사합니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민박 체험은 진짜다!
돌아가는 아침에 '또 오고 싶다',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제나 수학여행의 진면목이다. 강요하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무언가 남는 것이 있다. 그런 민박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다음에도 여기 오자'고 생각하고,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진다. '숫자가 아니라 밀도. 넓이가 아니라 깊이. 그것이 이제나섬 민박의 '질'입니다.










![2025년 5월 4일 한정] 이제나 해변에서 바나나 보트 체험! 가족과 함께 즐기는 GW 액티비티](https://izena-kanko.jp/wp-content/uploads/2025/03/bananaboat2025-150x150.png)